지난 해 말 인터넷 대중매체의 대명사격인 버즈피드(BuzzFeed)가 허프포스트(HuffPost)를 인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CEO 조나 페레티는 자신이 아리아나 허핑턴 등과 함께 설립한 허핑턴포스트(지금의 허프포스트)를 세우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페레티가 친정인 허프포스트에 대해 가진 애정이 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페레티는 허핑턴포스트에서 일하는 동안 일종의 실험으로 버즈피드를 만들었고, 허핑턴포스트가 AOL에 매각된 2011년 회사를 떠나 버즈피드를 독립시켜 인터넷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후 10년 만에 다시 허프포스트로 돌아온 셈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다.
조나 페레티가 떠난 후 AOL이 미국 통신기업인 버라이즌에 매각되면서 허핑턴포스트의 주인이 다시 바뀌었고, 이름도 허프포스트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광고를 크게 줄이면서 광고료로 운영되는 인터넷 매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상업성을 중시하는 버즈피드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허프포스트는 2천 만 달러(한화 22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이것을 본 조나 페레티는 버라이즌과 협상을 벌여 허프포스트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인수 완료에 이은 대량 해고
버즈피드는 직원들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회사로 유명하다. 2019년 초에 200명에 가까운 직원을 해고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직원들이 자신이 해고되는 건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경영진의 무성의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대량 해고로 "이제 버드피드의 실험은 끝났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팬데믹보다 1년 앞서 직원을 해고하는 바람에 비용이 절감된 버즈피드는 팬데믹을 무사히 통과했을 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허프포스트를 인수할 수 있었다. 그랬으니 허프포스트의 인수 후에 인력을 감축할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고, 허프포스트를 매각한 버라이즌 역시 그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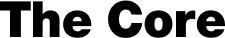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11/ivacbx_202511130202.png)
![[발표자료] GEO시대, 미디어채널 재설계 전략
- AI가 답하는 세상, 당신의 브랜드는 준비되었나요?](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povk3t_202509261048.jpg)
![[자료] AI 시대, 해외언론사들의 AI 도입 현황과 전략](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aqzesl_202509220109.10.png)
![[자료] AI 기반의 팩트체킹 방법론](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ebjijm_202509220114.18.png)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특강자료] PR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10/lwzhek_202410220533.JP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