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주의 문화학자의 원류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1974년(텔레비전론) 이렇게 물었다.
“테크놀로지는 원인인가 결과인가?”
그리고 더 나아간다.
“만약 테크놀로지가 원인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그것의 영향 내지는 효과를 일부 수정하거나 조정하는 정도일 것이다. 만약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테크놀로지가 결과라면 어떤 종류의 다른 원인이나 행동이 그 테크놀로지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다.”
예를 들었다.
“(1) 텔레비전은 과학기술적 연구의 성과로 발명되었다. 그후 뉴스와 오락을 제공하는 매체로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서 이전에 존재했던 뉴스와 오락 매체를 대체하게 됐다.”(p.47)
위 명제를 그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테크놀로지를 순전히 우연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발명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엄밀히 말해서 테크놀로지 그 자체의 내적 발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발명에 따르는 결과 역시 그것이 테크놀로지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연적이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이 발명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르는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사건들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p. 49)
지금도 우리는 미디어(기술)의 발명을 우연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고관에 익숙하다. 테크놀로지를 원인으로 받아들일 뿐, 결과물로서의 테크놀로지로 바라보며 그것이 구성된 맥락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빈약하다. 그저 원인로서의 테크놀로지에 “와우”를 연발할 뿐이며, 그것의 수용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제한다. 구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애플을 대하는, 삼성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에 다분히 묻어있는 보편적 경향이다.
심지어의 이용자와의 상호적 교류 속에서 변형되고 굴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다. 사용의 유연성은 일어날 때 그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일 뿐인 것이다.
40년 전 윌리엄스의 관점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낯선 어떤 것이다. 그의 문제제기는 지금도 유효하며, 더 깊은 진전의 뿌리로 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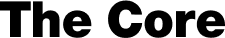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5/x0dz3a_202505170134.17.png)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컨콜 발언록 번역&정리[2024년 4분기 포함]](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8/p5wf0f_202408090239.22.png)
![[번역] 생성 AI가 저널리즘 노동에 미치는 영향](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7/c4pa5b_202407250540.18.png)
![[전자책] 디지털 뉴스와 테크놀로지, 그 대화의 역사](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7/0ixw96_202407230739.11.png)

![[법인] 연간 구독권 (3인상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1/imcylg_202501240833.png)
![[번역] 저널리즘과 생성 AI: 생성 정보 생태계에서 뉴스 직무 진화와 윤리](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4/ptclsm_202404150537.2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