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이 못 푼 문제: '헤이븐'은 왜 실패했나
미국에 살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새끼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움직이려고 할 때 마다 아프다고 울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응급실에서 두 시간 넘게 기다려 만난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였고, 간단한 검사(엑스레이 사진은 찍지 않았다) 한 두 가지를 해보더니 괜찮을 거라고 했다. 알약을 두 개 받고서 병원문을 나서니 날이 저물고 있었다. 그 알약은 진통제 타이레놀이었다.
다행히 아이의 손가락은 별 문제 없었지만, 충격은 일주일 쯤 뒤에 찾아왔다. 그날 병원을 방문해서 받은 '치료' 비용청구서엔 약 1천 500달러, 우리 돈으로 160만 원이 넘는 돈이 청구되어 있었다. 물론 그 금액의 대부분은 우리가 든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 우리는 25달러 정도만 내면 되었다. 말로만 듣던 미국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 불합리성을 직접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의료비는 미국 경제의 기생충
아래 <표1>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나라다. GDP의 비중으로 선진국 평균의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을 쏟아붓는 나라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국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 이하로 OECD의 최하위 수준이다. <표2>


미국의 의료비 중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OECD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말은 나머지 돈은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지불하는 의료보험료와 개인이 자기 부담으로 내는 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큰 병에 한 번 걸리면 파산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 70%가 저축해둔 돈이 1백 달러(110만 원) 미만인 나라이니 병에 걸리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 세계 최강대국의 현실이다.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이 의료비는 "미국 경제의 기생충(a hungry tapeworm on the American economy)"라고 했을 만큼 이 문제는 미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고민 중 하나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시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천국 답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업인들도 등장했다. 워렌버핏도 그들 중에 포함된다. 바로 2018년에 야심차게 시작한 헤이븐 헬스케어(Haven Healthcare)다.

실패한 실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헤이븐은 실패했다. 지난 4일 헤이븐 웹사이트는 "2월 말로 독자적인 운영을 끝낸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확하게 3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헤이븐 헬스케어는 상주 직원이 57명으로 큰 조직도 아니고 수익을 내기위한 기업도 아니었다 (비영리단체로 분류된다). 이렇게 작은 조직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헤이븐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세 사람의 거물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낸 단체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인들로 유명한 세 사람의 CEO가 뭉쳤는데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의료문제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 난제인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단순히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라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진단이다. 업계의 실력자들이 모였는데 풀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래서 곳곳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 헤이븐은 왜 실패했을까?
1) 불분명한 미션
2018년 헤이븐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목표는 "(3사의) 미국 직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잠재적으로 모든 미국인들을 돕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세 회사가 가진 자원으로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의 헬스케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전체의 헬스케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헤이븐은 미국 의료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아마존과 JP 모건은행,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헤이븐이 정확하게 어떤 실험을 하는 건지 아는 사람들은 없었다. 미국의 의료뉴스 언론인 스탯뉴스(Stat News)의 에린 브로드윈은 헤이븐이 "의료보험 시장을 바꾸고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3년 내내 모호한 채로 머물렀고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조직의 미션이 분명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단계의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나가면서 조직이 앞으로 나아간다. 헤이븐은 미션 자체가 모호했다는 것이다.
2) 부족한 마켓 파워
출범 당시 헤이븐은 "우리 세 개의 회사는 엄청난 자원(extraordinary resources)"을 가지고 있고 그걸 솔루션 찾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는 이들 세 개의 회사를 합치면 직원이 12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조직이지만 미국 전체의 의료시장을 생각하면 120만 명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만큼의 마켓 파워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격협상에 나설 수 있으려면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미국인들의 절반을 거느린 그룹이 탄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은 큰 조직이지만 충분히 큰 덩치가 아니었다.
3) 시스템의 역(逆)인센티브
미국 의료시스템이 가진 역인센티브(perverse incentive)는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 표적이다.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문제를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미국의 의사와 병원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아파야 돈을 번다. 환자가 찾아와서 비싼 치료를 받아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에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단일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는 다르다. 의료진에게 치료비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이 돌아가게 하고, 보험가입자들이 건강할 때 의료진에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병원)와 보험사가 일체여야 한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서비스만 현대화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경험없는 CEO
헤이븐은 출범하면서 하버드 의대의 교수인 아툴 가완디(Atul Gawande)를 CEO로 임명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Being Mortal)>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뛰어난 저술가이기도 한 가완디는 의료 행정분야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이븐 헬스케어를 이끌 적임자로 보였다.
하지만 잘 규정되지 않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스타트업 조직을 이끄는 것은 전혀 다른 재능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가완디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년 만인 지난 해 5월 CEO자리에서 물러났다.
5) 참여사의 다른 계산
그렇다고 헤이븐 헬스케어가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헬스케어 시장을 노리고 있던 베이조스에게 헤이븐은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베이조스는 헤이븐 헬스케어의 실험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아마존 케어(Amazon Care)'라는 쌍둥이 실험을 아마존 자체적으로 따로 진행했다. 원격진료부터 시작해서 처방약품 배달까지, 아마존이 의료시장에서 하려는 모든 사업을 아마존 직원들 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마존 케어는 헤이븐의 종료와 상관없이 진행 중이다. 특히 헤일로(Halo)라는 웨어러블 제품과 아마존 파머시(Amazon Pharmacy)라는 처방약 판매, 배달업 등으로 의료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아마존에게 헤이븐은 훌륭한 테스트 기회였기 때문에 "3년 동안의 헤이븐 헬스케어 실험에서 승자는 아마존"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의 설립자들은 대개 3번 이상의 실패 경험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성공을 해보지 않았어도 '하면 안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헤이븐 헬스케어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얻어진 경험은 의료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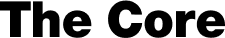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5/x0dz3a_202505170134.17.png)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컨콜 발언록 번역&정리[2024년 4분기 포함]](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8/p5wf0f_202408090239.22.png)
![[번역] 생성 AI가 저널리즘 노동에 미치는 영향](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7/c4pa5b_202407250540.18.png)
![[전자책] 디지털 뉴스와 테크놀로지, 그 대화의 역사](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7/0ixw96_202407230739.11.png)

![[법인] 연간 구독권 (3인상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1/imcylg_202501240833.png)
![[번역] 저널리즘과 생성 AI: 생성 정보 생태계에서 뉴스 직무 진화와 윤리](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4/ptclsm_202404150537.2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