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역사는 저널리즘의 역사임과 동시에 인쇄 기술의 역사이다. 인쇄 기술의 역사는 다시 속도 경쟁의 역사이다. 더 빠른 속도를 향한 열망은 인쇄 기술의 오늘을 낳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인쇄기, 통상 윤전기로 상징되는 신문의 인쇄 기술은 신문의 빠른 성장을 추동한 발판이면서, 신문이 더 빠른 미디어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기초였다.(지금은 신문사의 생명줄을 움켜쥐고 뒤흔드는 계륵으로 남아있다.) 신문의 역사를 살피는 작업은 그래서 속도의 의미를 깨닫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신문은 라디오, TV와 같은 더 빠른 미디어와의 속도 경쟁에서 보기 좋게 살아남았다. 인쇄기의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면서 그리고 컬러 오프셋 인쇄를 보편화하면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과의 속도 경쟁에선 탈이 나고 말았다. 속도 경쟁력을 상실한 신문사는 자연스럽게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속도는 신문의 운명이었고 생존 그 자체였기에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신문 인쇄 기술의 역사는 왜 신문이 디지털 대전회의 시대에 보다 더 빨리 치밀하게 적응해야 했는지 그리고 하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 글은 속도를 좇기 위해 신문의 인쇄 기술이 어떻게 발전돼왔는지를 살피기 위해 작성됐다. 또한 무엇이 속도 경쟁을 낳았고 그 속에서 어떤 기술이 형성됐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가적으로 인쇄 기술이 관련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히 분석해볼 생각이다.
윤전기의 발전 궤적과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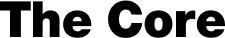



![[인터뷰] '자체 설계+개발' CMS가 동아일보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3/02/96tol2_동아일보.jpg)
![[기고] 이미지 생성 AI 확산과 중소 언론사의 혁신](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2/10/스크린샷_2022-10-07_오전_10.36.55.png)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11/ivacbx_202511130202.png)
![[발표자료] GEO시대, 미디어채널 재설계 전략
- AI가 답하는 세상, 당신의 브랜드는 준비되었나요?](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povk3t_202509261048.jpg)
![[자료] AI 시대, 해외언론사들의 AI 도입 현황과 전략](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aqzesl_202509220109.10.png)
![[자료] AI 기반의 팩트체킹 방법론](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ebjijm_202509220114.18.png)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특강자료] PR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10/lwzhek_202410220533.JP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