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경. 그의 나이 불과 32세에 출간했던 ‘철학과 굴뚝청소부'(1994년). 대학 1학년 과내 철학회 첫 세미나 교재였다. 1995년, 스무살에 만난 33세의 이진경은 뭐랄까, 이미 서양 근대철학를 자기화한 연구자처럼 크고도 크게 보였달까? 발랄하고 쉬우면서도 깊이를 놓치지 않았던 그 한 권의 책으로 나름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던 계기가 됐다. 그 덕에 표재명 교수의 ‘실존주의 철학’ 수업까지 낼름 신청하는 객기를 부리기도 했지만. 사실 그의 저서를 ‘맑스주의와 근대성’까지 따라가다 이내 멈췄다. 열 페이지를 넘기기조차 버거웠다. 난해했고 복잡했다. 사유의 복잡도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따라 끝이 말아올라가고 있다는 인상이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스치듯 흘겨보다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한 구절을 다시 만났다. (1994년 발행본엔 없었습니다. 2004년 발행본이 맞습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 446쪽의 문구란다. 읽었던 기억마저도 흐릿하지만 쿵 와닿는다.
“인문학의 경우에는 위기의 원인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모두 소비가 아닌 생산의 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문학의 위기란 언제나 일차적으로 생산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소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지식과 교양, 예술을 알아보고 소비하는 대중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생산할 능력의 부재,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생산물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봤다.
“저널리즘의 경우에는 위기의 원인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모두 소비가 아닌 생산의 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널리즘의 위기란 언제나 일차적으로 생산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소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지식과 교양, 예술을 알아보고 소비하는 대중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생산할 능력의 부재,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생산물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얼추 들어맞는다. 그의 문제 의식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살아움직인다. 그는 32세에 인문학뿐 아니라 전체 담론 세계의 위기를 깨달았고 난 30대 후반에서야 겨우 저널리즘 위기의 곁가지들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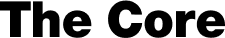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5/x0dz3a_202505170134.17.png)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컨콜 발언록 번역&정리[2024년 4분기 포함]](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8/p5wf0f_202408090239.22.png)
![[번역] 생성 AI가 저널리즘 노동에 미치는 영향](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7/c4pa5b_202407250540.18.png)
![[전자책] 디지털 뉴스와 테크놀로지, 그 대화의 역사](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7/0ixw96_202407230739.11.png)

![[법인] 연간 구독권 (3인상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1/imcylg_202501240833.png)
![[번역] 저널리즘과 생성 AI: 생성 정보 생태계에서 뉴스 직무 진화와 윤리](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4/ptclsm_202404150537.2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