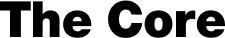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뉴스 넷플릭스' 꿈꾸는 애플, 어떤 언론사가 검토할까
애플이 올해 안에 뉴스 구독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뉴스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제안을 받은 언론사들은 다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일단 뉴욕타임스의 입장이 되어볼까 합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온리 구독 매출의 증가율입니다. 2017년 1분기-2018년 1분기 : 20.5% 2018년 1분기-2018년 4분기 : 9.3% 아직 2019년 1분기 집계치가 나오지 않아서 성장세가 어떻게
열린우리당이 반서민 정당인 이유
“우리는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의 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의 건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열린우리당 정강정책의 한 글구다.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의 구현…. 하지만 정작 중산층과 서민들은 열린우리당에 극도의 반감을 지니고 있다. 최근의 지지율 하락도 이들 중산층과 서민들이 외면한 탓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양원가 공개되면 집값 잡힐까?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만에 이 문제가 다시 한국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한 셈이네요. 저는 지난해 건설교통부를 출입하면서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경실련의 주장을 많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수용을 거부했죠. 대신 그 대안으로 분양가 원가연동제라는 어설픈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원가연동제는 판교의 땅값을
경제부에서 편집부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6월 1일자로 부서를 이동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 경제부로 옮겼는데요, 약 1년 만에 다시 부서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경제면을 편집합니다. 때때로 간단한 기사도 쓰게 될 것 같구요. 독자분들이나 시민기자들께서 주문하신 기사는 반드시 짬을 내서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유차의 환경기여도 그리고 경유값 인상 등에 관한 기사는 이주 내로 출고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경부 차관 내정자의 반서민적 ''경쟁지상주의''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성규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괜히 짜증날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네요.^^ 며칠 전 한 시민기자가 김제와 논산에 대형할인점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한 지역 재래시장 상인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이 대형할인점이 지역에 들어설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골프장 100개 지으면 된다고?
박병원 차관보가 20일 정례브리핑이 끝난 뒤 “골프장 100개만 지으면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날텐데 ngo 때문에 …”라며 혀를 찼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골프장을 입에 달고 사는 고위급 공무원의 발언이라 더더욱 그렇다. 박병원 차관보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건설경기 밖에 없는 것 같다. 알려져 있다시피 건설부문은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큰 편이다.
Pivot To Video의 실패와 페이스북의 상업성
“영상으로 옮겨 타기”는 페이스북의 지표 부풀리기에서 비롯됐다는 증거가 나왔네요. 광고주들은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거는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페이스북은 동영상 광고의 시청시간 지표를 부풀려서 광고주들에게 “영상 광고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풀린 지표에 현혹된 광고주들은 지불 의사 이상을 영상 광고에 집행했는데 결국 이 건이 소송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1800년 이후 미국 신문 제호의 증감 추이
출처 : https://multimediaman.wordpress.com/tag/the-first-newspaper/ NEWSPAPER PRESERVATION ACT: A CRITIQUE
(린) 스타트업은 테일러 넘어서려는 과학적 방법론이다
스타트업은 과학이다. 창업이 과학이라기보다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것이라는 의미다. 에릭 리스가 ‘린 스타트업’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스타트업의 성공은 좋은 유전자의 결과나 시기, 장소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그의 지론은 “올바른 프로세스를 따름으로써 성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다. 과학적 프로세스를 따르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명제는
유튜브와 허위정보, 알고리즘의 통제
더 많이 보게하려는 욕망과 의도적인 허위정보의 연속 노출이 상충할 때 유튜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유튜브는 사실상 검색 서비스입니다. 입력된 정보값에 대응해 가장 정확한 영상 정보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자들이 유튜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알고리즘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Up next'(다음 동영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