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오송에 볼 일이 있어 KTX를 이용해 다녀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사물을 보며 KTX의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면서,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KTX가 언덕 하나 없는 광활한 평지 사막을 달린다면, 우리는 그 속도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창밖은 모래에 반사된 빛과 보이지 않는 공기만 가득합니다. 기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송역으로 질주한 KTX처럼 시속 300km로 질주할 수도 있고, 무궁화호처럼 상대적으로 천천히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밖의 환경이 위와 같다면, 열차 안에 탑승한 저로서는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망원경을 통한 천체 관측으로 뒷받침했습니다. 1632년에 출간된 그의 책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에는 유명한 ‘갈릴레오의 배(Galileo’s Ship)’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갈릴레오의 배는 어느 특정 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레오가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을 위해 설정한 가상의 배입니다. 갈릴레오는 ‘가정’을 합니다. 균일한 속도로 곧게 나아가는 배의 창문 없는 선실에, 사람이 파리, 나비와 같은 곤충과 함께 있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정지해 있을 때도 그리고 배가 흔들림 없이 일정한 속도로 달릴 때도 곤충은 사방으로 자유롭게 날고, 물방울은 똑바로 아래 그릇에 떨어집니다. 왜 갈릴레오는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17세기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의 논리는 “지구가 동쪽으로 빨리 돈다면, 탑에서 떨어뜨린 공은 서쪽으로 빗나가야 하고, 동쪽 또는 서쪽으로 쏜 포탄의 사거리도 달라야 한다”였어요. 갈릴레오 배는 가속이 없는 균일운동에서는 선실 내부 실험만으로 배가 달리는지 멈췄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송으로 향했던 KTX의 속도를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사물’ 때문입니다. 밖을 볼 수 없는 배 또는 기차 안에서 외부의 도움이 없다면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도, 외부 기준이 없으면 속도를 잴 수 없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동설과 지동설이 논쟁하던 17세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아니 인류는 지금 AI라는 ‘밖을 볼 수 없는 갈릴레오의 배’에 함께 탔습니다. 바닥에서 간단치 않은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AI는 분명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는 AI는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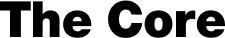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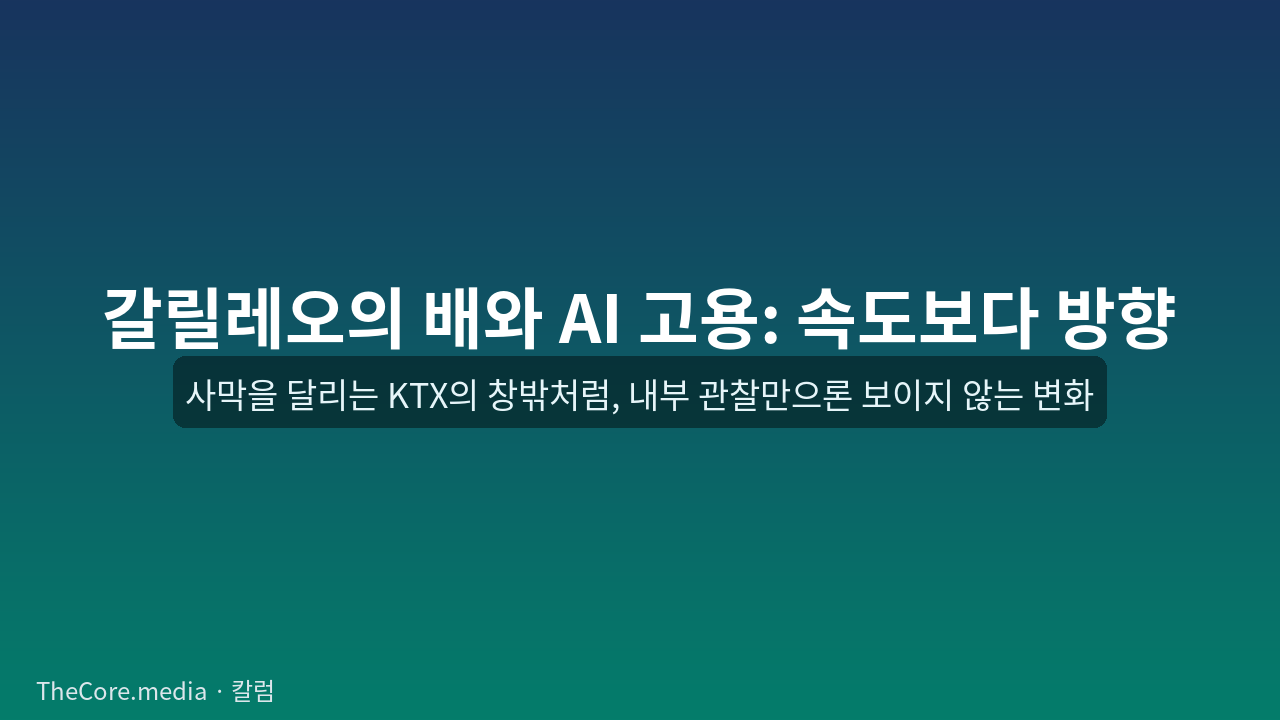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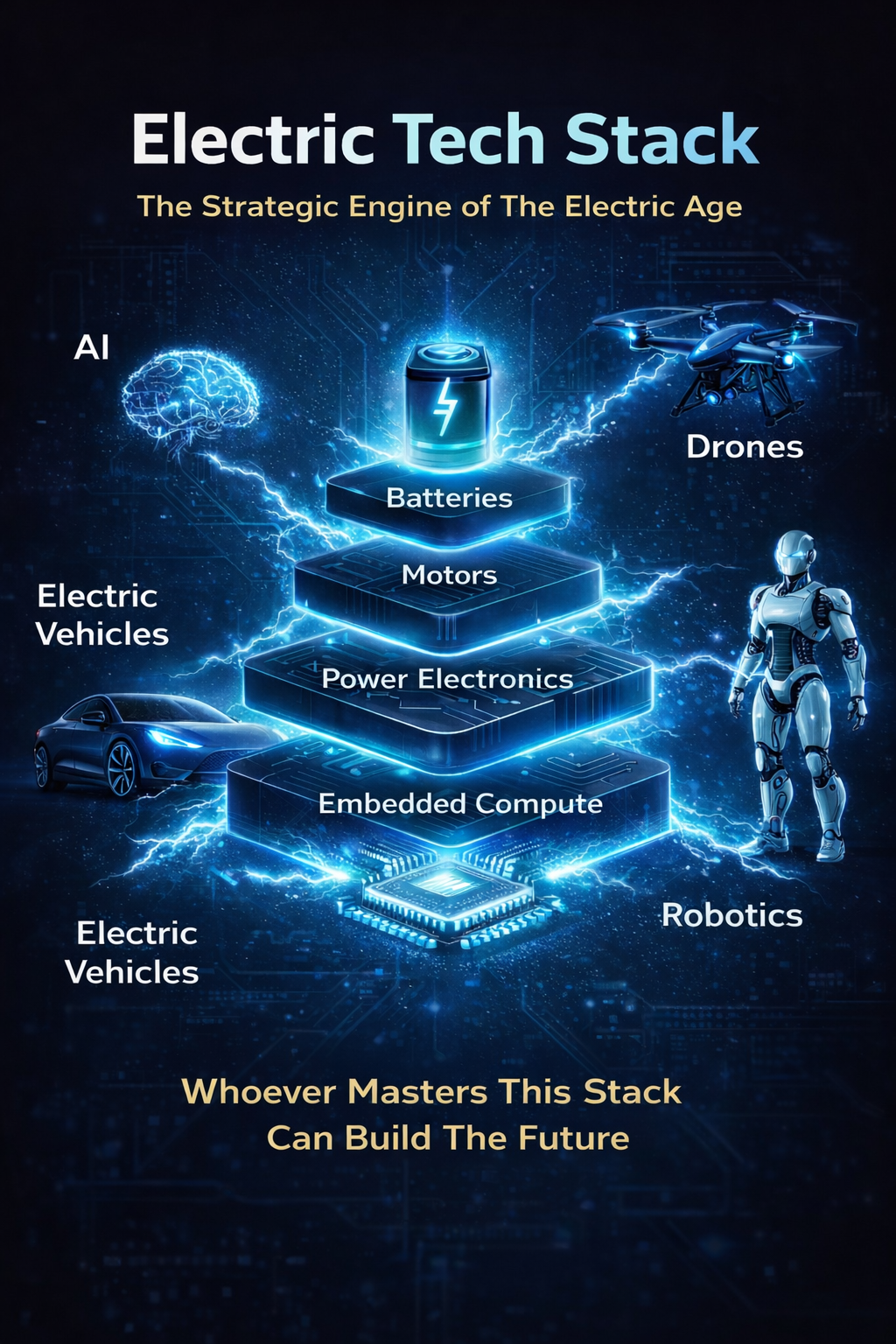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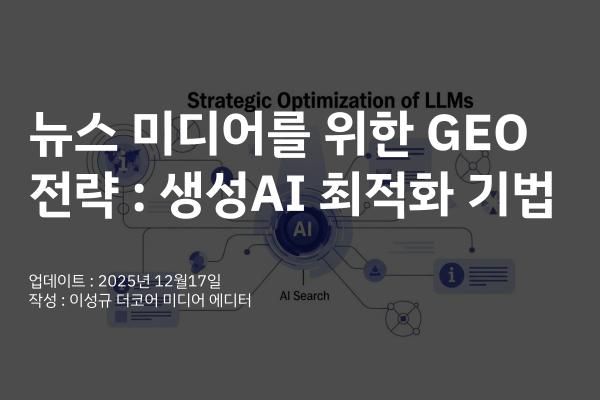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11/ivacbx_202511130202.png)
![[발표자료] GEO시대, 미디어채널 재설계 전략
- AI가 답하는 세상, 당신의 브랜드는 준비되었나요?](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povk3t_202509261048.jpg)
![[자료] AI 시대, 해외언론사들의 AI 도입 현황과 전략](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aqzesl_202509220109.10.png)
![[자료] AI 기반의 팩트체킹 방법론](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ebjijm_202509220114.18.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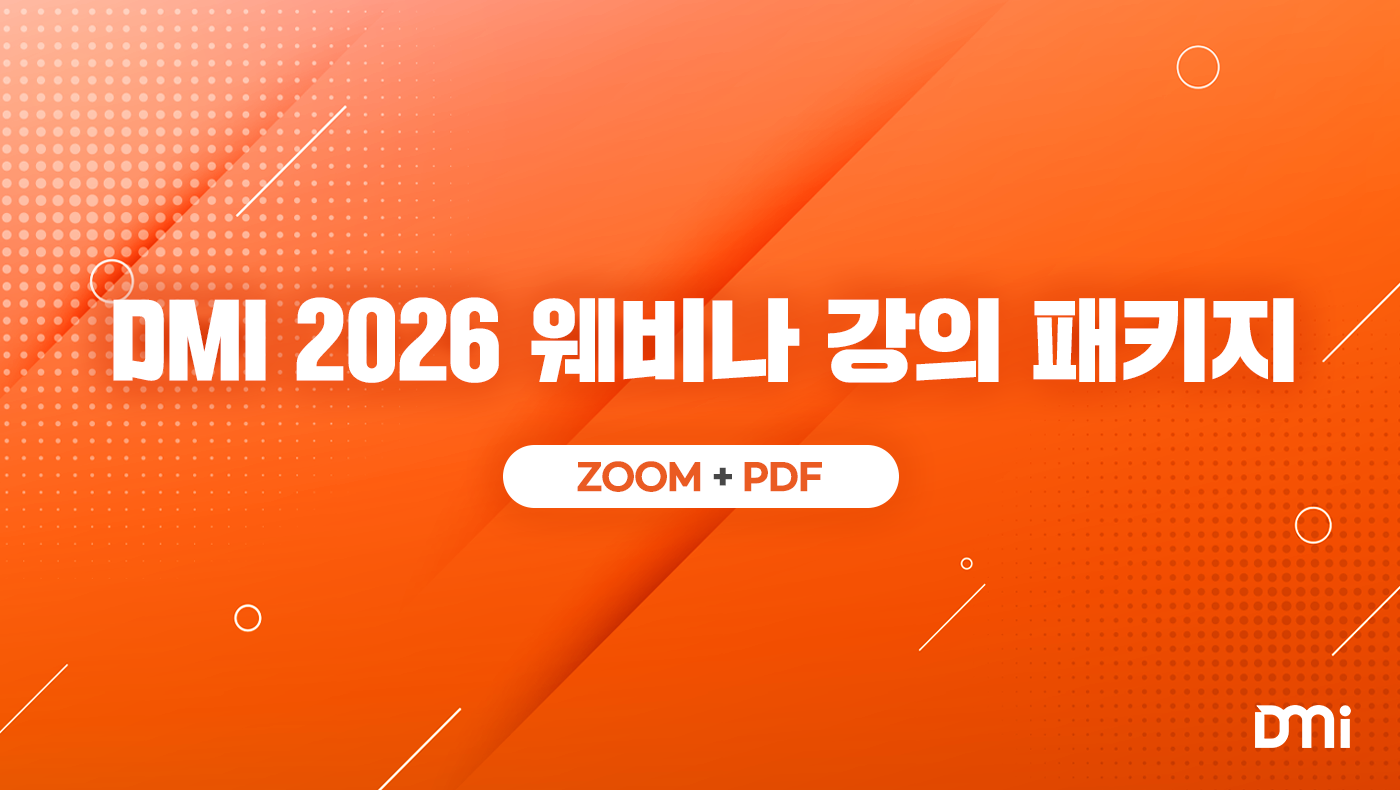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특강자료] PR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10/lwzhek_202410220533.JP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