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문화’ 연구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근대 유럽의 인쇄미디어 혁명’에서 아이젠슈타인은 인쇄술의 혁명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심지어 민주주의의 원인이 됐다는 일반적 관념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일축한다.
“르네상스는 인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이탈리아에서 이미 시작됐고 종교개혁 당시에 인쇄술은 신교와 구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었으며, 과학혁명은 고대 자연 철학자들의 권위 있는 서적의 광범위한 배포로부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고대의 권위를 비판하면서 자연을 해석하는 새로운 이론적, 실험적 방법론이 제창되면서 진행됐다. 인쇄술이 지식을 민주화시켰다는 주장도 과장된 것인데 16~17세기는 물론 18세기 내내 종이의 원료가 비사서 일반 대중이 쉽게 사기에는 책값이 너무 비쌌고 이와 맞물려서 18세기 초엽까지도 유럽의 문맹률이 60~70%에 이르렀다.”
기술이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기술이 원인이 되어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녀의 논점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술은 변화를 증폭시키고 가속화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1] 이런 관점은 최근까지 이어져 David Edgerton 킹스 칼리지 런던대 교수는 새로운 기술에만 주목하는 역사학자들의 경향이 기술이 낳는 사회의 변화가 급격하다는 환상을 가져왔다고 비판한다.(https://workspace.imperial.ac.uk/historyofscience/Public/files/51.3.edgerton.pdf, 홍성욱 ‘기술결정론과 그 비판자들’, p.17 재인용)
기술과 혁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가운데 현재 우리(특히 한국 사회)는 기술결정론에 지나치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출되고 있다. 기술을 행위자로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술은 사회와 호흡하고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협상하고 타협한다. 그것이 기술의 역사였고 기술의 진화였다.
기술만이 모든 사회 변화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는 편향된 인식은 늘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권에 관계 없이 동일하다’ ‘기술의 영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는 논리로 나아간다. 이런 인식은 결국 레이먼드 윌리암스의 논리를 동원해 설명하자면 인간은 테크놀로지를 그저 수용만 해야 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것이 기술을 설계한 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유토피아일까?
[1] : George H. Daniels.(1970). The big Question in the History of American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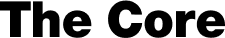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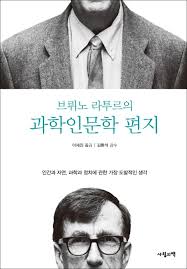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5/x0dz3a_202505170134.17.png)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컨콜 발언록 번역&정리[2024년 4분기 포함]](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8/p5wf0f_202408090239.22.png)
![[번역] 생성 AI가 저널리즘 노동에 미치는 영향](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7/c4pa5b_202407250540.18.png)
![[전자책] 디지털 뉴스와 테크놀로지, 그 대화의 역사](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7/0ixw96_202407230739.11.png)

![[법인] 연간 구독권 (3인상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1/imcylg_202501240833.png)
![[번역] 저널리즘과 생성 AI: 생성 정보 생태계에서 뉴스 직무 진화와 윤리](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4/ptclsm_202404150537.2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