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전이 끝날 무렵인 1969년. 43세의 젊은 CEO 설즈버거(Arthur Ochs Sulzberger)는 뉴욕타임스를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큰 성장과 지속적인 확장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해야 했기에,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장은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상장 뒤에도 설즈버거 가문의 소유권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설즈버거 가문은 1896년부터 뉴욕타임스를 소유해 왔습니다. 자칫 상장이 이 전통과 지배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장 또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설즈버거는 의결권에 약한 Class A를 상장하고, 가문은 Class B를 보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는 미국 신문사들 사이에서 상장의 붐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1963년 다우존스를 시작으로 1964년 타임스 미러, 1967년 개닛, 1969년 뉴욕타임스와 나이트리더 그룹이 모두 상장에 성공했습니다(Meyer, P., & Wearden, S. T. , 1984).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미국 언론들은 대략 이 시기에 자사 주식의 공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신문의 황금기를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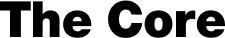

![[브리핑] 네이버, 롯데카드 인수하나?](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5/8ulfhd_202505261328.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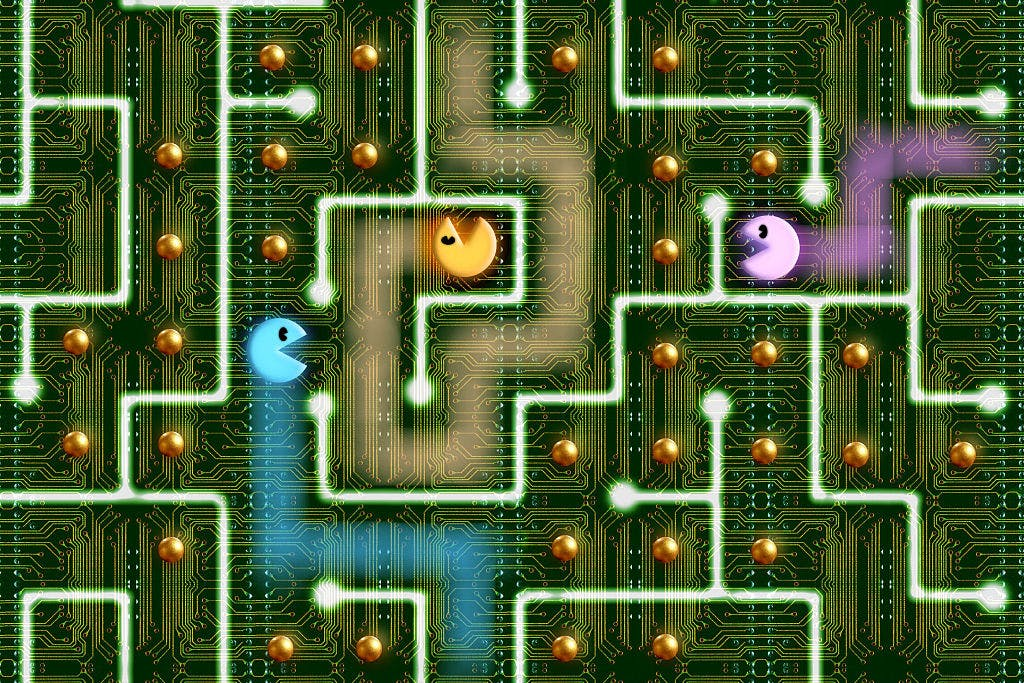
![[브리핑] '성장vs신뢰' 리벨리온-사피온 깜작 합병...배경과 효과는?](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6/119dt4_202406180514.jpg)
![[브리핑] WWDC 2024: 애플, 디바이스로 AI 시장 제패?](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6/nj56ps_202406110549.jpeg)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11/ivacbx_202511130202.png)
![[발표자료] GEO시대, 미디어채널 재설계 전략
- AI가 답하는 세상, 당신의 브랜드는 준비되었나요?](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povk3t_202509261048.jpg)
![[자료] AI 시대, 해외언론사들의 AI 도입 현황과 전략](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aqzesl_202509220109.10.png)
![[자료] AI 기반의 팩트체킹 방법론](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ebjijm_202509220114.18.png)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특강자료] PR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10/lwzhek_202410220533.JP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