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전성시대입니다. 무료를 넘어 유료 시장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유료 뉴스레터 시장 얘기입니다.
마케팅용 시장과 유료 콘텐츠용 시장으로 분화되고, 여기에 다시 빅 네임과 스몰 네임 시장으로 나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수수료 하락 경쟁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플레이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비록 먼나라 미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국내 시장에 미칠 효과는 그리 작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 : Beehiiv와 Memberful
Beehiiv

아직 정식 론칭하지 않은 스타트업입니다. 이름도 유명한 모닝 블루 출신의 개발자가 준비하고 있는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뉴스레터 기반으로 콘텐츠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닝 블루의 2번째 사원이었던 타일러 덴크(Tyler Denk)와 모닝 블루의 엔지니어였던 벤자민 하게트(Benjamin Hargett) 그리고 또다른 한 명이 공동 창업자로 결합했습니다. 시드 투자에 참여한 VC들은 "뉴스레터라는 공간은 여전히 초기 시장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아직 더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Beehiive는 두 유형의 고객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틈새 분야를 다루는 크레에이터와 수백 만 명의 팔로어를 지닌 크리에이터입니다. Axios의 보도를 보면 상위 1% 크리에이터보다는 자신의 콘텐츠로 보다 수월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틈새 시장 크리에이터를 우선하는 정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emberful

멤버풀은 페트리언의 자회사죠. 멤버십 구축을 도와주던 플랫폼이었죠. 하지만 이틀 전 뉴스레터도 추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놓고 서브스택과 경쟁하겠노라 선언까지 했습니다.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10%의 수익배분 방식을 택하고 있는 서브스택과 달리, 4.9%는 수익으로 배분하고 대신 프리미엄 플랫폼 이용료를 가져갑니다. 뉴스레터 콘텐츠의 유료화로 수익을 크게 올리지 못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겐 플랫폼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멤버풀의 CEO인 드류 스트로이니는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 멤버십 모델에서 매우 기본적이어서 이는 우리가 해야 꼭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멤버십 자격을 만들갈 때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거의 당연하더군요"라고 했습니다. 멤버십 플랫폼을 위해서라도 뉴스레터 기능을 '더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뉴스레터 기능을 보면 서브스택보다 우월한 지점을 발견하긴 어렵지만, 기존 멤버풀의 기능에 더해지는 구성이라 나름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디애틀랜틱의 뉴스레터

디애틀랜틱의 움직임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쿼츠를 떠나보냈지만 와이어드 편집장 닉 톰슨을 CEO로 영입했던 디애틀랜틱은 서브스택 작가를 빼앗아오기 위한 뉴스레터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노골적으로 서브스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기본급(그렇다고 정규직 채용은 아닙니다)입니다. 서브스택 작가들이 디애틀랜틱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일단 기본급을 지급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달성할 때마다 추가 성과급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못지 않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서브스택의 로컬 뉴스 이니셔티브와 약간 비슷한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준-독립적인 위치를 보장하긴 하지만, 약간의 편집에 대한 간섭은 어쩔 수 없나 보더군요. 서브스택도 콘텐츠 정책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이보다 조금더 엄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 입장에선 몇 가지 유익이 더해집니다. 해당 작가의 유료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디애틀랜틱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리패키징 상품을 내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애틀랜틱이 더 많은 자체 유료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서브스택의 몇몇 핵심 작가를 유인하려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유료 뉴스레터가 '격전지' 되고 있을까
얼마전 포인터(Poynter)에 '기자들이 언론사의 정규직 일자리를 그만 두고 프리랜서로 향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례를 경험한 기자가 직접 쓴 기고문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몇 구절만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동안 내 저널리즘 경력이 외적 압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간 신문에서 일한 5년 동안 나는 반복적으로 급여 인상과 책임/권한 조정을 두고 싸웠지만 매번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오래 머물거나 열심히 일하면 그 방향이 뭔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이제 지치다 못해 영원한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I had felt for a while that my journalism career was being dictated by external forces. In five years at daily newspapers, I repeatedly fought for raises and responsibility tweaks only to be told to wait. That direction kept me in eternal limbo, drained by the feeling that if I just stayed long enough or just worked hard enough, something might change."
사실 미국 내 기자 사회가 흔들린 지는 하루이틀은 아닙니다. 적은 급여에 불안정한 일자리는 끊임없이 이탈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 기자들의 무력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브스택이 이 빈자리를 노리며 기자들을 설득해서 영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들 기자들에게 또는 능력 있는 작가들에게 생존을 위한 '대안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불안정한 언론사나 직장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데스크의 성화를 감내하면서 "기다려달라"는 경영진의 요청을 믿어가면서 또 한해, 또 한해를 버텨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가나 크리에이터, 전직 기자를 위한 다양한 구독 플랫폼들이 출현하고 있고 실제 성공사례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 직장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 분의 얘기를 조금더 들어볼까요?
"내가 원했던 것은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나에게 중요한 스토리를 피칭하고 실제로 그것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을 내어주는 에디터들과 함께 일하고, 스토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가능한 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내 작업물을 다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내가 운 좋게 주어진 전문적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뒷걸음질 치지 않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 조금더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기대가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택하게 한 것이죠.

통계로도 이러한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 4000명을 대상으로 업워크(upwork)라는 곳에서 설문한 자료를 보면, 18%가 프리랜서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26%는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약 절반 가까이가 프리랜서 전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선 프리랜서 인구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크리에이터 집단들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더이상 직장의 위계적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자기 삶을 지속가능하게 살고 싶어한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리게 되면서, 위 스타트업들의 전략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국내 언론계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까


사실 국내 언론사 내 기자들도 상당한 '이직 압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를 그만 두고 이탈하는 규모는 꾸준하게 늘어나고도 있고요.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될 수준입니다. 특히 10년 차 이하에서 이러한 흐름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흐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을 경쟁적으로 빨이들이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힘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약해서일 겁니다. 성공 사례도 적은 편이고요.
서브스택처럼 물꼬를 틀 수 있는 힘이 작동하고 증명까지 된다면, 봇물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얼룩소의 사례에서 언론사 내 기자들의 이탈 열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가시화하면 사내 능력 있는 기자 집단의 퇴사는 지금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력 있는 기자들의 미래가 밝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몸담고 있는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만약 디애틀랜틱처럼 준-독립적 기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곳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한 곳이라고 생긴다면 이 업계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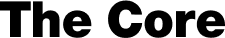


![[미디어 브리핑] Substack, '100만 달러 수익' 기자 두 자릿수 돌파 등](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8/8vnbor_202408132252.jpeg)
![[미디어 브리핑] 서브스택, 채팅에 유료 장벽 도입 발표 등](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5/agxnx1_202405012156.05.png)

![[Aug. W3] 유료 구독자 붙잡은 서브스택 신기능 + 유니콘의 멸종 위기](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3/08/isjzig_Screenshot_202_1121.png)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5/x0dz3a_202505170134.17.png)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컨콜 발언록 번역&정리[2024년 4분기 포함]](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8/p5wf0f_202408090239.22.png)
![[번역] 생성 AI가 저널리즘 노동에 미치는 영향](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7/c4pa5b_202407250540.18.png)
![[전자책] 디지털 뉴스와 테크놀로지, 그 대화의 역사](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7/0ixw96_202407230739.11.png)

![[법인] 연간 구독권 (3인상품)](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1/imcylg_202501240833.png)
![[번역] 저널리즘과 생성 AI: 생성 정보 생태계에서 뉴스 직무 진화와 윤리](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4/ptclsm_202404150537.2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