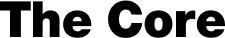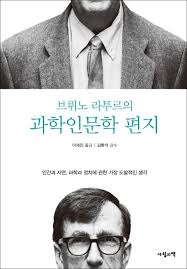대선 때 미 유권자 5000만명 유출...영국 데이터 업체 내부자 폭로
보도 원문 : Revealed: 50 million Facebook profiles harvested for Cambridge Analytica in major data breach 내용 요약 :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데이터 분석 업체는 지난 대선 기간 중 페이스북 사용자 5000만명의 프로필을 세부적인 수준까지 수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대로 트럼프의 선거 전략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 당사자는 바로 트럼프 캠프의 전략자문이었던 스티브 배넌. 그리고
맞춤형 사회와 Networked Vertical Media의 보편화
스탠리 데이비스(Stanley Davis) 의 ‘Future Perfect’가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훌쩍 지났다. 대량맞춤화(Mass Customizing)라는 파격적이고 모순적인 개념은 대량생산과 규모의 경제를 신화처럼 믿고 있던 당대의 경영학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던져줬다. 그러나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의 전망과 예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개인들의 다양한 취향을 수용하면서도 대량생산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27만→5000만...페이스북 유출 데이터는 왜 불어났나
개인정보에 대한 저커버그의 인식 페이스북 데이터 스캔들의 씨앗은 2010년에 뿌려졌다. 기술은 설계자의 가치체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기술 설계자가 살아온 배경, 그리고 기술을 대하는 철학이 기술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을 구성하게 된다. 2010년 1월, 페이스북 창업자인 저커버그는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
댓글 논란에 대한 나의 짧은 생각들
댓글 논란에 대해 간단히 저의 견해를 적으면. 아웃링크가 대안일까? 나의 결론 : 조건부로 대안이 되기 어렵다 1) 언론사의 댓글 관리 능력 : 포털과 달리 국내 언론사는 댓글만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거의 없다.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소셜댓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외부에 관리를 맡겨야 하는
페레티의 아홉가지 상자가 던진 수익 전략
페레티의 9가지 상자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입니다. 가로가 브랜드 축이라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레티가 설명하듯, 뉴스미디어를 먹여살릴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수익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고? 광고만으로 조직을 지탱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프로그래머틱 바잉이든, 브랜디드 콘텐츠든 단 하나의 수익 방식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 : 첫번째 편지-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과학기술의 자율성을 다시 생각하기 과학과 기술은 지나치게 자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한다.(21) 그들은 말하기를 “다행스럽게도 과학은 정치의 관심사, 분쟁, 이데올로기, 종교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권위는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적입니다. 바로 여기에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참이거나 효과적입니다.”(22) 내 강의의 목표는
비영리 저널리즘의 수익모델과 사용자경험 그리고 독자
사라진 관점 ‘독자’ 즉 오디언스 수익모델은 사용자들과의 교환 행위다.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후에 따라붙는 보상체계다. 제공의 가치가 달라지면 보상받는 규모와 방식, 유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관념이 존재한다. 이 명제는 좋은 저널리즘은 공짜가
딥러닝의 한계로 본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개리 마르커스 뉴욕대 교수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개리 마르커스 교수는 지난 1월 발표한 에세이 ‘Deep Learning: A Critical Appraisal'(딥러닝 : 비판적 평가)에서 딥러닝의 한계를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목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얕은 지식을 배우고 지식 재활용이 힘들다.
테크 기업이 유발한 도시 불평등...어떻게?
거대한 테크 스타트업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은 무엇일까. 샌프란시스코는 중산층의 무덤이 됐다. 승자들의 도시가 됐고, 중산층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그들을 살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었고, 혹여 살아낸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중하층으로 전락하는 불운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글의 저자인
추천 알고리즘과 소비 제어의 관계
베니거가 설명하는 소비의 제어는, 홍보/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서 실현된다. 180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제어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산의 과잉 상황이 도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 제어의 혁명이 뒤따르게 됐다. 최초의 1800년대 중후반 크로웰에 의해 전국 광고, 트레이드마크와 패키징 상품이 등장한 건 그래서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소비 제어의 핵심은 피드백 시스템과 그것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