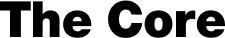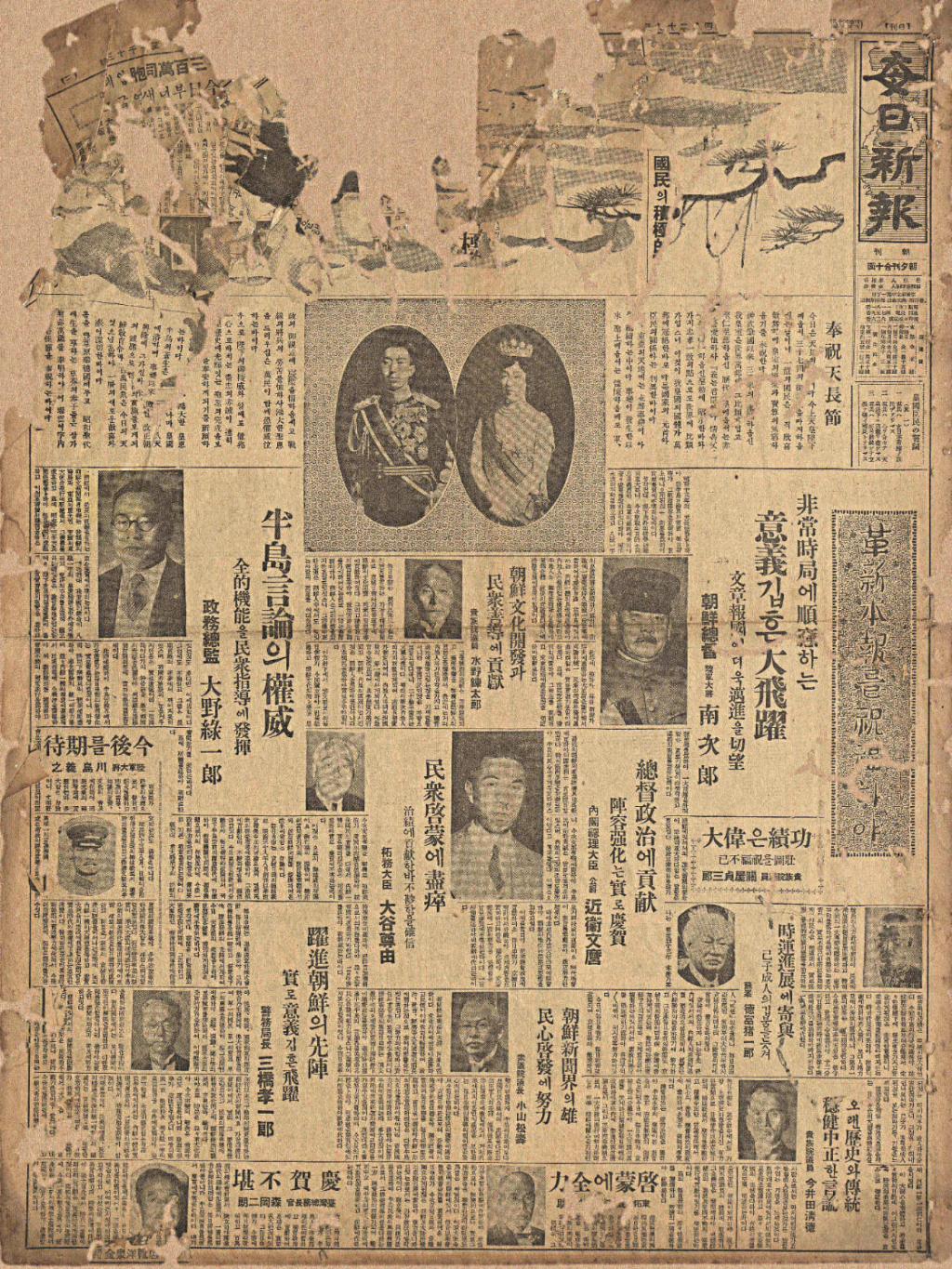뉴욕타임스 2017-2018 매출 현황표
!function(){"use strict";window.addEventListener("message",function(a){if(void 0!==a.data["datawrapper-height"])for(var t in a.data["datawrapper-height"]){var e=document.getElementById("datawrapper-chart-"+t);e&&(e.style.height=a.data["datawrapper-height"][t]+"px")}})}();
'공기업' 서울신문의 미뤄진 민영화와 호반건설 지분 인수
서울신문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호남 기반의 건설기업인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지분 19.4%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6월25일 언론을 통해 공개돼서입니다. 아직 공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19.4%는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1,614,000주입니다. 호반건설은 이 지분을 전량 인수함으로써 서울신문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사실 의결권 지분으로만 따지면 21.55%
NYT의 AI 측정툴 Readerscope와 디지털 광고 매출
언론사가 AI를 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봇 기자만을 상상하며 ‘기자 업무의 대체’를 염려하는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의 반복적인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도 하나의 적용 대상입니다. 광고주들은 어느 때보다도 효율이 높은 집행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고토사 콘텐츠 연령별 선호도
미디어고토사 블로그를 4월 중순쯤 새롭게 단정하고 나서 처음으로 연령별 선호 데이터를 집계해봤습니다. 연령별 소비 패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례 분석을 선호한다 :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기술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헤럴드, 가디언, 네이버-카카오까지. 거시적인 미디어 트렌드보다 개별 기업들의 사례
언론사 디지털 영상 실험의 한계와 해결 방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라’. ‘성공의 과실만 보려고 하지 말고, 성공을 만들어낸 접근법을 배우시라’라고 말이죠. 결국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듯합니다. 미디어 소비의 결정 구조 : 먼저 아래의 계층 구조를 봤으면 합니다. ‘제가 도식화해본 구조입니다. 시대는 세대를 낳고, 세대는 미디어 플랫폼을 낳고, 미디어 플랫폼은 새로운 포맷을
NYT 메튜 정치담당 기자가 허위정보 추적 위해 활용하는 기술들
뉴욕타임스의 ‘Tech We’re using’ 시리즈에, 정치 허위정보 추적을 담당하는 메튜 로젠버그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더군요. 이 코너는 코너명에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실제 자신의 업무에 어떤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때마침 조작적 허위정보의 추적을 담당하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이야기가 실렸기에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봤습니다. 개인메신저 ‘
플러리시를 활용한 다양한 시각화 사례(ex, 대선주자 지지도 추이 등)
1. 라인 차트 아래는 오마이뉴스 8월6일자 기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 이낙연 25% 오차범위 밖 첫 1위… 황교안 19.6%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플러리시의 라인차트로 시각화해본 사례입니다. 플러리시는 구글 뉴스랩과 협약으로 맺고 전세계 언론사들에게 유료 계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구글 뉴스랩 소속입니다.) 장점 1 : 지지율(sc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