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스트 자긍심의 복원은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연결 관계를 탐색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널리즘이 공공적 가치와 결합하지 못하고 그것과의 함수관계가 과거보다 더 모호해진다면 저널리스트라는 전문직으로서 호칭과 위상은 사회적으로 평가받기 어려워집니다. 그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고소득 직종 혹은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과의 관계 맺기가 가능한 특권 계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집단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이러한 위상으로 남아있거나 추락할 경우, 수용자/여론의 수탁자로서의 특권적 접근권은 인정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회의로 되돌아 오게 되는 것이죠.
‘여론'의 저자이자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초기에 정초했던 월터 리프먼의 고민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을 어떨까요?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저널리즘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초기 리프먼이 저널리즘을 정의해 가는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연구한 과정과 틀거리, 동원된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동일한 접근으로 재구성해본다면, 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안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대 민주주의의 변화와 문제를 분석했고, 여기서 여론-행정부의 관계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1차 대전 당시 육군 정보장교로 참전해 쓴 맛을 봤던 ‘베류사유 조약'의 관철 실패가 ‘여론’을 쓰게 된 직접적인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그는 1차 대전 중 미국 육군정보국 대위로 참전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그가 애착을 드러냈던 작업이 ‘14개조 평화원칙 원안' 작성이었죠. 리프먼은 14개조 가운데 8개항을 썼으며 심지어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 초안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에는 국제연맹 설립 정도의 1개 조항만 받아들여졌고, 이 1개 조항도 미국 상원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은 ‘자유와 뉴스'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여론’의 출간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담은 강준만(2017, p.105-106) 교수의 설명을 잠시 곁들여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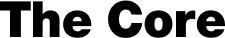

![[니먼랩 2026 저널리즘 전망] 재설계가 필요하다!](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12/1rw0lp_202512080447.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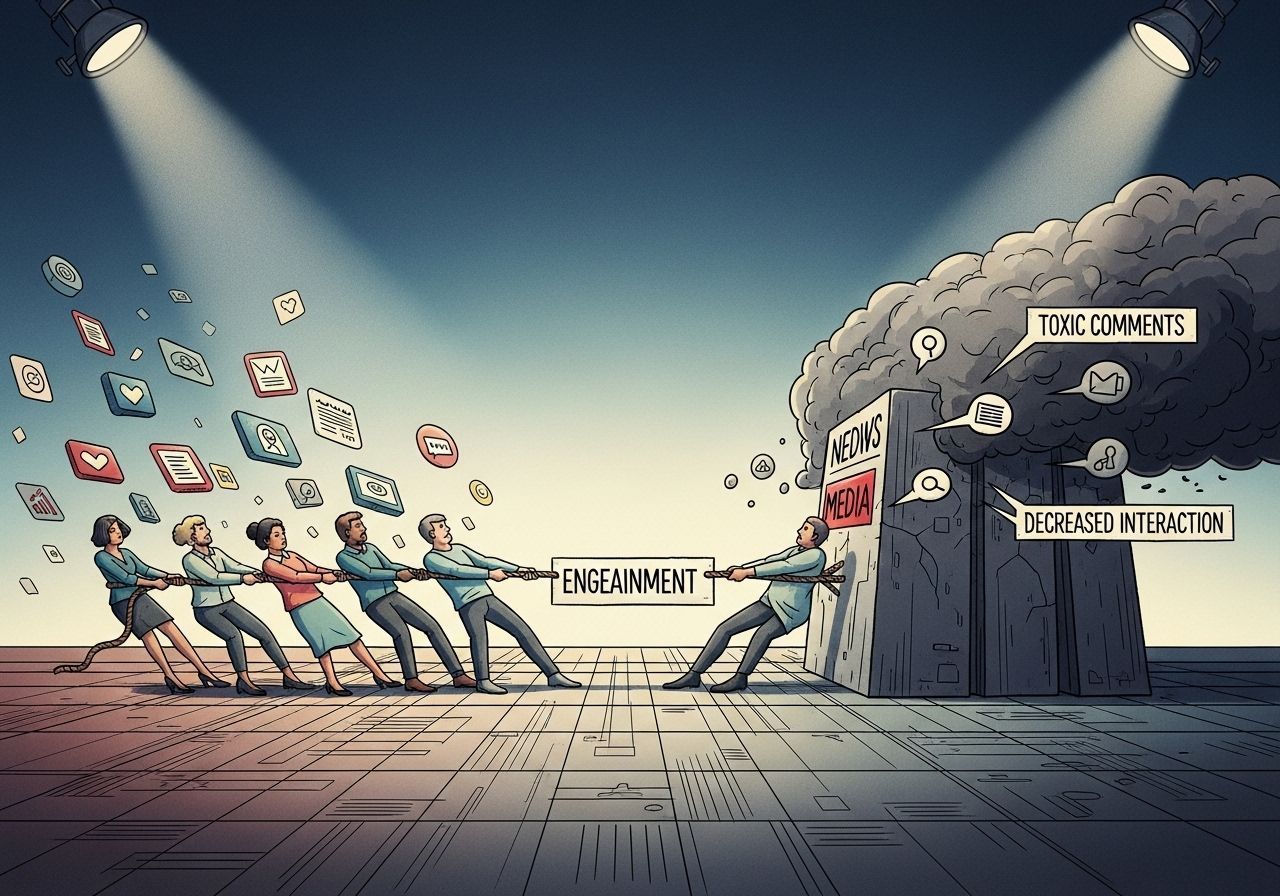

![[리포트] 2024년 저널리즘 전망 - 로이터 연구소](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01/28n4vc_저널리즘리포트_로이터_2024.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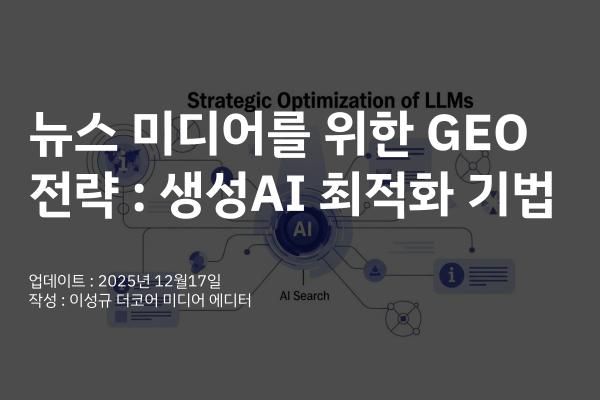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11/ivacbx_202511130202.png)
![[발표자료] GEO시대, 미디어채널 재설계 전략
- AI가 답하는 세상, 당신의 브랜드는 준비되었나요?](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povk3t_202509261048.jpg)
![[자료] AI 시대, 해외언론사들의 AI 도입 현황과 전략](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aqzesl_202509220109.10.png)
![[자료] AI 기반의 팩트체킹 방법론](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ebjijm_202509220114.18.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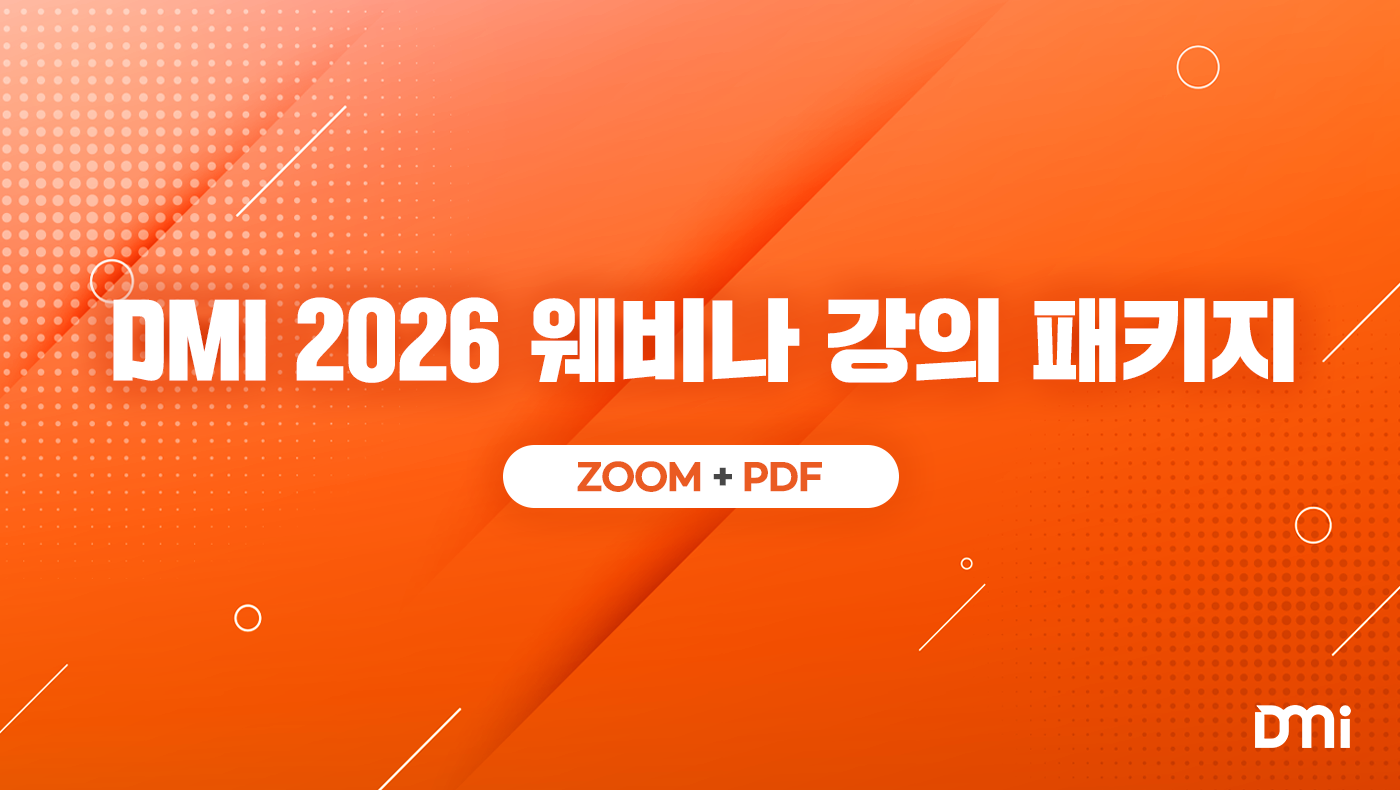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특강자료] PR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10/lwzhek_202410220533.JP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