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신문 기자들은 방송 기자를 기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괄시도 했다. 방송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그들의 이너서클에서 배척했다. 출입처에서의 차별은 기본이었다.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1970년대 기자실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어쩌다 기자들이 총회를 하는데 정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은 두 명이 출입해도 1진만 인정한다는 기왕의 규약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기자이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관례가 지켜지던 시절이었다. 내가 더욱 소외감을 느꼈던 것은 대학동기나 후배들은 신문이나 통신 소속이라고 자격이 되고, 나는 방송 소속이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기자협회보, 2000.12.9]
하지만 방송이 신문의 영향력을 역전하자 상황은 뒤바뀌었다. 출입처 담당자들은 신문 기자보다 방송 기자를 더 우대했다. 방송 시간 마감을 신문 마감보다 더 예민하게 다뤘다. ‘더 깊이 있는 뉴스로 승부하는 매체”라며 위안하곤 했지만 현실 속에서 신문 기자의 위상 하락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2000년대 초 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와 같은 인터넷 신문이 등장했을 때, 신문 기자들과 방송 기자들은 이들을 대우하지 않았다. 출입처 등록을 기자들이 거부하는가 하면, “기수가 안 맞다”는 말로 동료 기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생산하는 기사에 대해선 “기사가 아니다”, “격 떨어진다”며 폄훼했다. 지금은 오히려 이들 인터넷 언론사들인 신문을 집어삼키고 있다.
또 다른 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ㅍㅍㅅㅅ나 피키캐스트일 수도 있다. 미국에선 버즈피드이기도 하다. 이들을 향한 기자들의 시선은 방송을 바라보던 신문 기자의 시선과 닮아있다. 늘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전 시대의 미디어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태도와 관점으로 일관했다.
이들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판단하긴 어렵다. 어떤 플레이어가 생존하게 될지도 예측하긴 쉽지 않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미디어의 대안적 힌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 일부에 전통 미디어의 미래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마냥 “두고 보자”고 얘기하기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안될 것 같다”고 내팽개치기엔 독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새로운 미디어를 향한 ‘관성적 회의론’은 늘 도태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가 현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외면하지 말고 일단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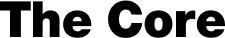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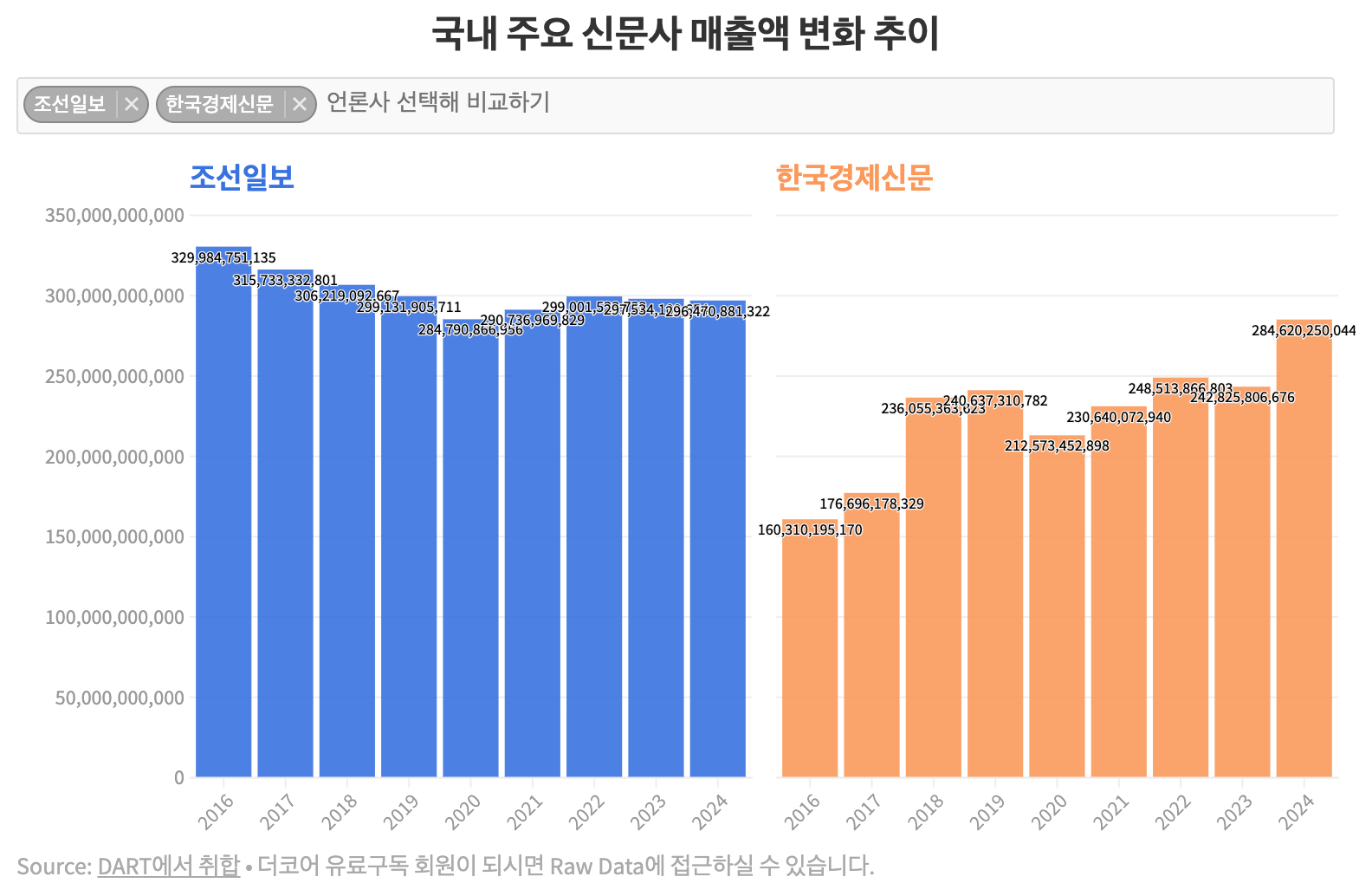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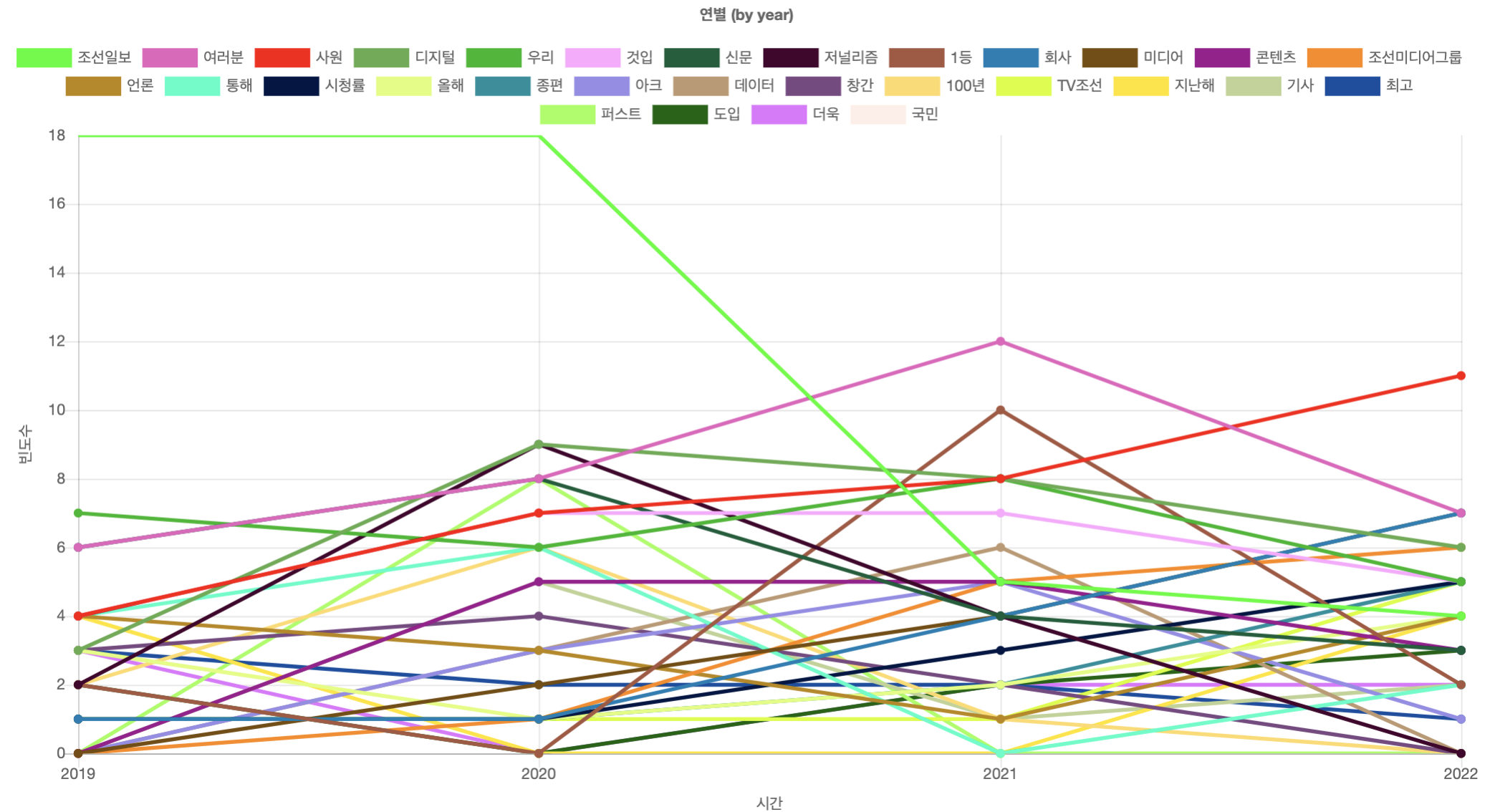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11/ivacbx_202511130202.png)
![[발표자료] GEO시대, 미디어채널 재설계 전략
- AI가 답하는 세상, 당신의 브랜드는 준비되었나요?](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povk3t_202509261048.jpg)
![[자료] AI 시대, 해외언론사들의 AI 도입 현황과 전략](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aqzesl_202509220109.10.png)
![[자료] AI 기반의 팩트체킹 방법론](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ebjijm_202509220114.18.png)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특강자료] PR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10/lwzhek_202410220533.JP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