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책을 인출할 때 감인관, 감교관, 창준, 수장, 균자장은 한 권에 한 글자의 오자가 나오면 태(笞) 30대를 치고, 오자가 한 글자씩 늘어날 때마다 1등을 더한다. 인출장은 한 권에 한 글자가 혹 먹이 짙거나 희미하면 태 30대를 치고 한 글자마다 1등을 더한다. 틀린 글자수를 모두 합해 죄를 다스리되 관원은 다섯 자 이상이면 파출하고 창준 이하 장인은 죄를 물을 뒤 사일(仕日, 공무원의 근무일) 50일을 깎는데, 모두 사전을 가리지 않는다.”(대전후속록 예전, 아세아문화사, 1983, 45면)
지금은 언론, 출판사 내에서 교열기자의 지위가 크게 낮아지거나 사라지고 있지만, 조선 시대 교열/교정은 당대 최고 문인들의 몫이기도 했다.(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세종대엔 교열/교정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교열/교정에 상당한 정확도를 보였단다.
인쇄 자체가 귀하던 시절, 특히 왕명 혹은 관찰사의 판단으로 인쇄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오탈한 한 자는 당시 지식인 사회에 자칫 ‘오보'(한자 한 자 오자는 Context 자체를 굴곡시킬 가능성을 낳기에)를 만연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렇기에 오자 한 자에 볼기 30대를 치는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을까.
디지털 퍼블리싱 툴이 넘쳐나고 모바일 디바이스가 보편화한 요즘이야 오탈자는 일상적인 실수로 언제든 실시간 교정 가능한 대상이 됐다. 유독 오탈자를 많이 내는 나야, 오탈자 한 자에 볼기짝 안 맞고 사는 시대에 태어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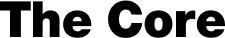


![[신간 소개] '루터 브랜드가 되다'로 본 인쇄기술 확산의 2가지 교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mediagotosa/2022/02/-----------2022-02-03-------12.44.52.png)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11/ivacbx_202511130202.png)
![[발표자료] GEO시대, 미디어채널 재설계 전략
- AI가 답하는 세상, 당신의 브랜드는 준비되었나요?](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povk3t_202509261048.jpg)
![[자료] AI 시대, 해외언론사들의 AI 도입 현황과 전략](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aqzesl_202509220109.10.png)
![[자료] AI 기반의 팩트체킹 방법론](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ebjijm_202509220114.18.png)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특강자료] PR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10/lwzhek_202410220533.JP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