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방송 6월호에 기고한 글이 공개가 됐네요. 제가 발제하고 제가 쓴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즈피드 뉴스'를 사실상 문닫으려고 하는 버즈피드 쪽의 태도와 정책을 바라보며, 한번은 이 과정을 맥락적으로 비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거든요. 치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뉴스는 돈이 안된다'라는 인식을 국내에서도 확산시키거나 공고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도 전문을 모두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글을 쓴 뒤 저는 다시, 버즈피드의 탈플랫폼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버즈피드, 참 오묘한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버즈피드는 자신을 배우려 애쓴 올드 미디어 뉴욕 타임스처럼 되지 못했다. 둘 모두 시장에 상장된 뉴스 미디어 기업이지만, 한쪽은 주가 하락을 명분으로 해고와 뉴스룸 해체를 종용하는 투자자에 시달 리고 있고 다른 한쪽은 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버즈피드는 그렇다고 액시오스처럼 독립된 플랫폼으로 수익 모델을 더 빠르게 키워가지도 못했다. 2021년 부랴부랴 ‘미디어 커머스 기업’을 표방하며 전면적인 전환에 나 섰지만, ‘조금 더 일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기고 있다.
버즈피드는 ‘저널리즘은 돈이 안 되는 거야’를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편견을 강화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조나 페레티의 고집스러운 플랫폼 의존 전략과 네이티브 광고 의존이 빚어낸 경영상 의 비극임에도 연쇄 해고라는 결과는 미세한 원인 분석을 잊게 만들었다. 복스미디어(Vox Media), 액시오스와 같은 건강한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이 건 너편에 존재함에도 이들을 압도해버리는 여론을 형 성해 버렸다. 무엇보다 플랫폼 기생 비즈니스를 경계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는 첫 타깃 은 저널리즘과 뉴스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버즈피드 뉴스 초기부터 근무하며 워 싱턴 D.C. 지사장까지 올랐던 케이트 노세라(Kate Nocera)조차도 올초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회사가 뉴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진심으로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을 정 도였다. 대형 플랫폼에 대한 집착이 저널리즘에 적합한 수익 모델 도입을 늦췄다는 맥락에서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벤처캐피털 펀드 기반의 미디어 스타트업 모델은 적정 시점에 ‘흑자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냉혹한 명제 다. 국내 밴처캐피털 투자자라고 해서 자본의 본질 적 속성에서 비켜나 있지 않다.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한 저널리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들은 언제건 부정적 태도로 돌변하고 만다. 최근 닷페이스의 해 산 소식은 적정 규모의 수익을 기대 시점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이 드리울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버즈피드가 해고를 택했다면 닷페이스는 해산을 선택한 점이 다를 뿐이다.
블루닷에이아이의 공동창업자 겸 대표이자, 더코어의 미디어 전담 필자입니다. 고려대를 나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언론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거쳐, 미디어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메디아티'에서 이사로 근무했고 구글에서 티칭펠로, 뉴스생태계 파트너십 경험도 쌓았습니다. '트위터 140자의 매직', '혁신저널리즘'(공동저작), '사라진 독자를 찾아서', 'AI와 스타트업', 'AI, 빅테크, 저널리즘' 등을 집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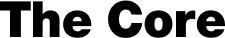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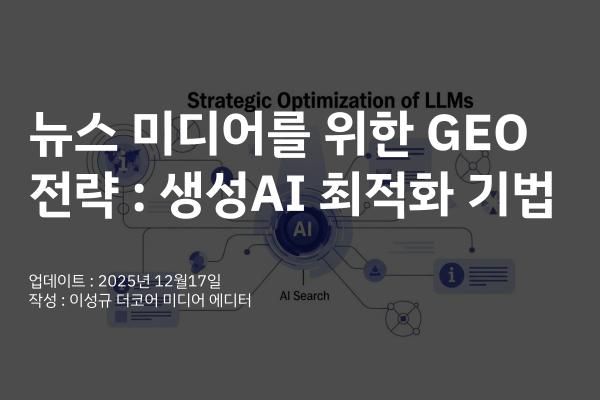
![[자료] '제로 클릭' AI 검색이 뉴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11/ivacbx_202511130202.png)
![[발표자료] GEO시대, 미디어채널 재설계 전략
- AI가 답하는 세상, 당신의 브랜드는 준비되었나요?](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povk3t_202509261048.jpg)
![[자료] AI 시대, 해외언론사들의 AI 도입 현황과 전략](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aqzesl_202509220109.10.png)
![[자료] AI 기반의 팩트체킹 방법론](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9/ebjijm_202509220114.18.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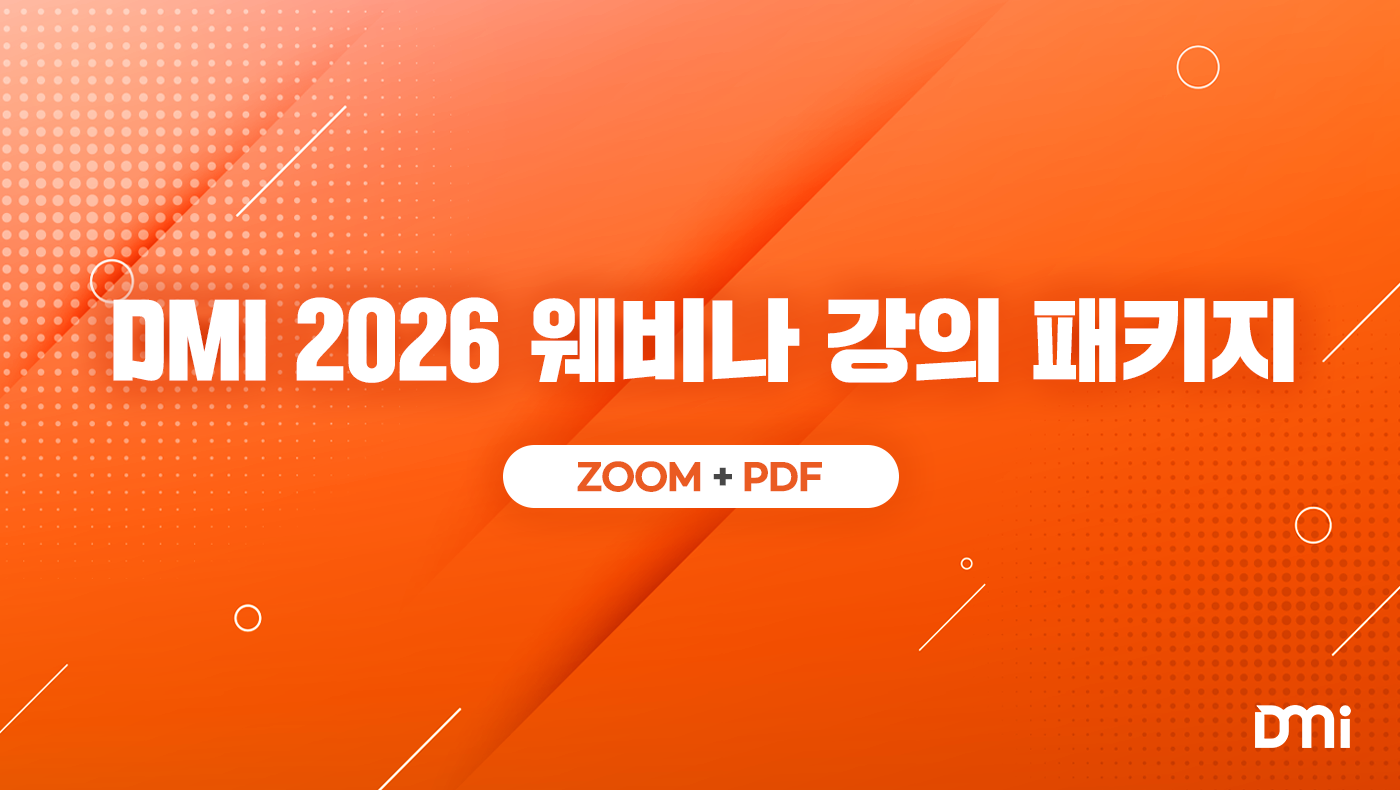

![[자료] AI 검색과 PR & 브랜드 마케팅의 대전환](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4/el4rkl_202504220930.25.png)
![[특강자료] PR 업무 현장에서의 AI 활용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4/10/lwzhek_202410220533.JPG)
![[자료] 기자와 언론사를 위한 생성AI 활용 방안](https://cdn.media.bluedot.so/bluedot.thecore/2025/03/r69w3p_202503180637.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