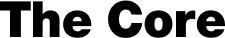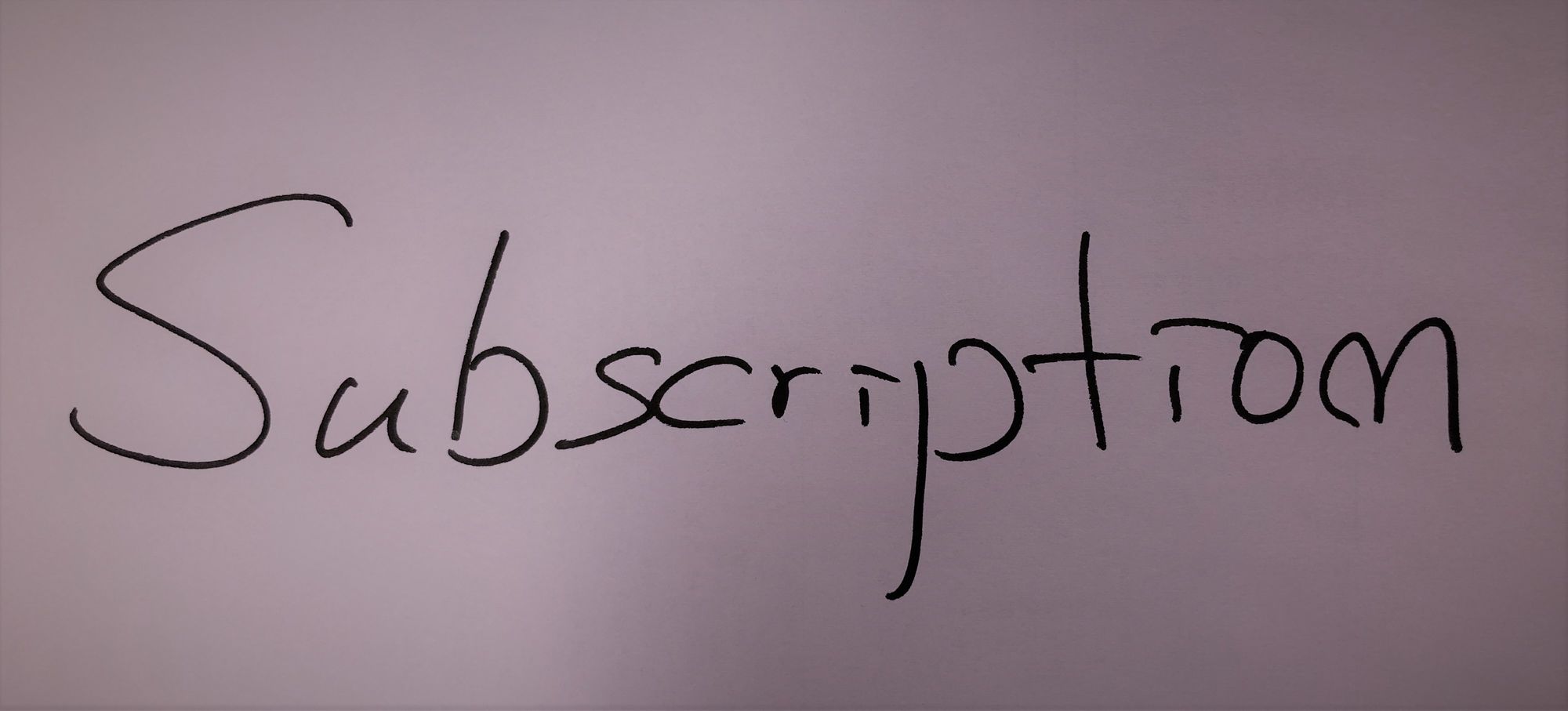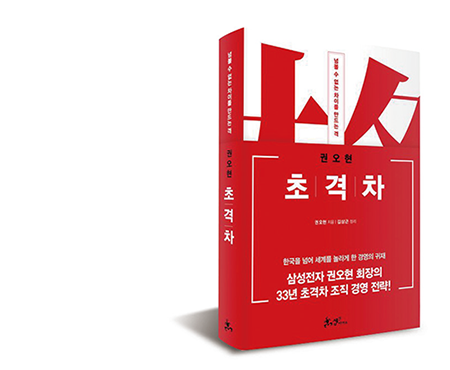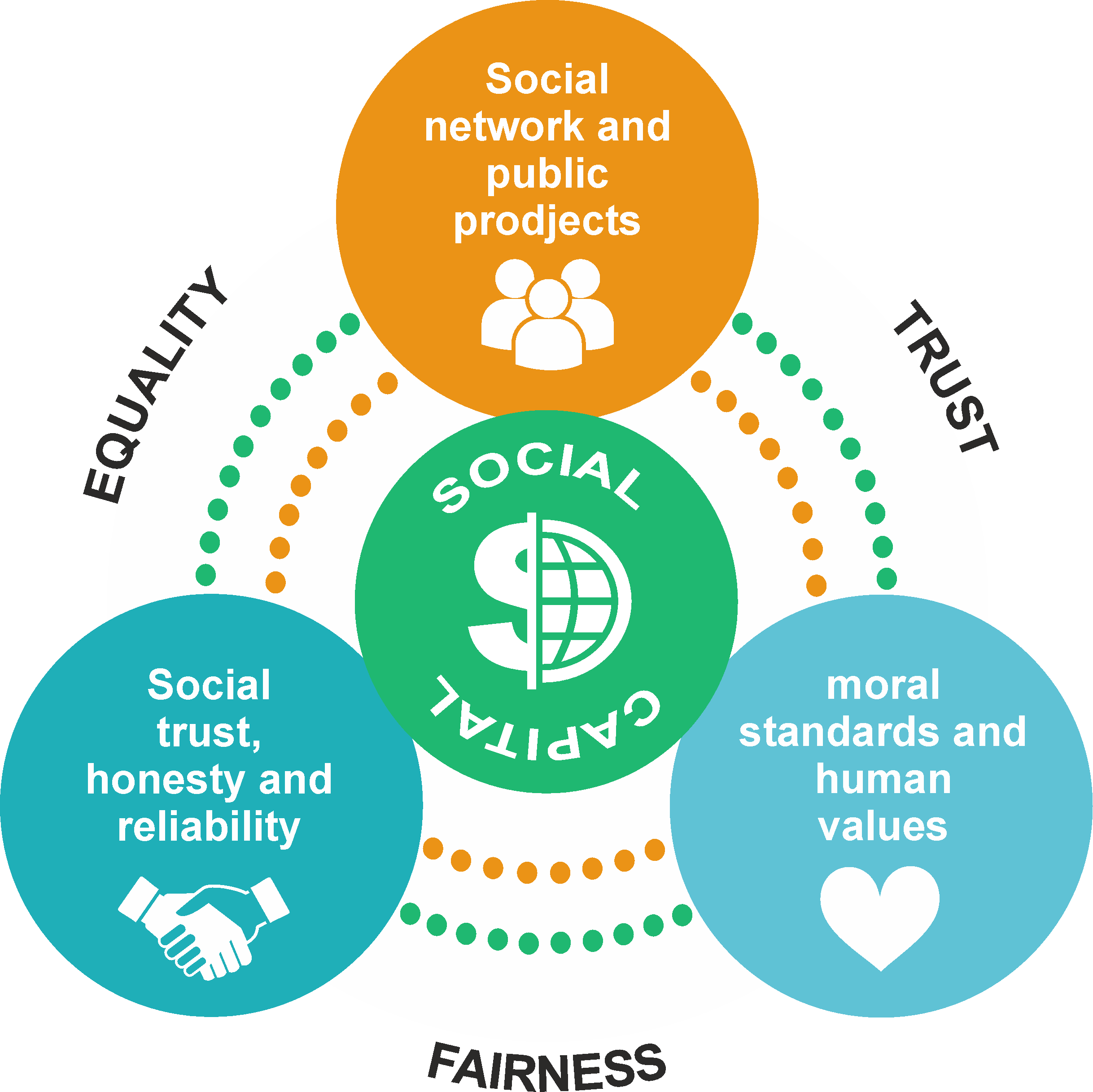간단한 신상 보고
벌써 3주가 흘렀네요. 7월1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니 거창해보이네요. 새로운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구글 뉴스랩 소속의 티칭 펠로(한국)라는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2년 여간 몸담았던 메디아티를 떠난 게 맞습니다. 구글 뉴스랩 티칭 펠로는 말 그대로 교육(Training)이 주된 업무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교육할 만한 깜냥은
포어의 '생각을 빼앗긴 세계'와 실리콘밸리
1부 : 생각을 독점하는 기업들 1 실리콘밸리 문화의 기원 도구가 독점 산업과 군국주의자들에 손아귀에서 풀려나서 개인에게 주어지면 개인은 더욱 자족적이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스로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p.34) 1960년대 말에 퍼스널 컴퓨팅의 모든 기초는 개발되었따. (35) 홀어스 카탈로그는 반문화의 가치들을 테크놀로지로 변모시켰다. (36) 앨린 케이는
1960년대 컴퓨터 식자의 초기 단계
원문 : Early steps in computer typesetting in the 1960s 1961-1964년 마이클 바넷의 “식자(typesetting) 실험“ 1961년, MIT의 부교수인 Michael Barnett는 사진식자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펀치형 종이테이프 출력을 생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이것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부터 “테일”(Tail)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했고, 사진식자 보도 자료도 제작했다.
마침내 흑자 전환 가디언, 무엇을 배워야 할까
뉴스 업데이트 : 2019년 8월 8일 : 가디언의 모회사인 가디언미디어그룹이 올해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미 3개월 전에 80만 파운드의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대로 인정이 됐나 봅니다. 뉴스 : ‘적자지만 훌륭한 언론’의 대명사 가디언이 마침내 흑자 전환 됐습니다. 캐서린 바이너 편집국장이 취임한 이후 시행된 턴어라운드 전략(흑자
엑시오스 성과가 뉴스 스타트업에 주는 교훈
엑시오스는 특별합니다. 이미 꽉 차 있을 듯한, 기존 시장 영역을 침투하겠다는 무모함도 그렇고요. 초기 창업 멤버들의 구성도 그렇습니다. 기존 뉴스 문법을 파괴해온 실력도 결코 평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과연 될까’라는 우려는 그들이 2년 만에 이뤄낸 성과 앞에서 이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명쾌했습니다. 모바일이라는 환경에서 수용자들은
뉴스 미디어 리더들이 읽어야 할 '초격차'라는 경영서
권오현 삼성종기원 회장의 초격차엔 언론사 리더들이 새겨야 할 원칙과 조건이 여럿 포함돼있었습니다. 삼성을 취재하는 관점이 아니라 언론사 리더들이 성찰해야 할 관점으로 접근하면 얻을 게 꽤나 많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부터 협업이 단절된 조직적 사일로를 넘어서는 방식, 리더에게 꼭 필요한 덕목으로서 겸손의 태도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뉴스/정보는 누군가의 레고가 될 순 없을까
Prompt : Can't news/information be someone's LegoImage by Flux 1.1 Pro영어 Engagement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담이지만 GNI Innovation Challenge Round 2 발표를 준비하면서 통역하시는 분들께 engagement를 참여로 번역하는 건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토머스 백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Participation과 Engagement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비유를
'알고리즘 편집' 경험자의 강한 만족 현상, 왜일까?
지난 8월29일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포털 등의 알고리즘 배열 전환 이후 모바일 뉴스 이용 행태’였습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국내 뉴스 이용자들이 알고리즘 배열 방식에 대해 어떤 인식과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였습니다. 일단 이 보고서의 결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용자들은 알고리즘에 따른
닷페이스 2019년 사업전략과 독자 관계 설정
닷페이스는 2019년 사업계획을 영상으로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모두 6가지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3가지를 의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닷페를 유튜브 맛집’으로주력 플랫폼을 페이스북이 아닌 유튜브 중심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현재 구독자의 80%가 유튜브를 통해 알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여기에 더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피드에 닷페이스가